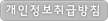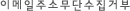|
[에이블뉴스]자립생활정책 속 척수장애인은 배가 고프다 |  |
10,259 |
 |
관리자 |  |
2017.05.24 |
탈시설 위주에서 탈재가와 탈병원까지 확대 필요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5-24 09:27:07
1972년 자립생활센터(CIL)를 처음 만든 미국의 에드로버츠는 버클리대학교내의 코웰병원에서 지체장애학생프로그램(PDSP)을 받고 있었고 지역사회에서의 생활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기 위해 투쟁을 하게 된다. 이후 1974년 보스턴자립생활센터(BCIL)에서는 병원이나 재활시설로부터 지역사회로의 전화과정 중의 일시적인 주거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 자립생활정신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1984년 최초의 일본자립생활센터(JCIL)인 휴먼케어협회가 생긴다. 당시 일본의 장애인시설에서 있었던 중증의 장애인들에게는 지역사회에서 사는 것이 꿈이 아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었다. 1997년 서울국제장애인복지대회에서 일본의 자립생활운동이 소개되었고, 이후 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하면서 일본의 휴먼케어협회와 함께 국내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한국의 자립생활운동은 자립생활센터와 함께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다 하지만 작금의 ‘탈시설=자립생활’이라는 공식은 너무 작위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립생활센터를 최초로 만든 에드로버트도 중도에 소아마비로 중증의 장애인이 된 경우로 대학재학시절 병원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을 했다. 일본의 경우에도 시설장애인들은 물론 집에서 칩거하거나 장기적으로 병원생활을 하는 근육장애인들도 자립생활을 꿈꾸고 성공을 했다.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재직하고 있는 이광원 본부장이 2000년대 초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연구회장을 하면서 발표한 ‘자립생활운동의 세계적 추세와 사례’에 있는 글이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우리가 탈시설화를 논하기에 앞서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의 삶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개인에서 사회로 이전시키는 것”이며, 그 이후에 탈 시설을 애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2009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들과 시설 장애인들이 ‘탈시설’ 권리를 주장하며 63일 동안 진행한 장기농성이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탈시설 정책을 약속했고 탈시설은 자립생활이라는 불문율 같은 공식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서울복지재단의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는 2009년 시범사업 이후 2010년 5월에 설치되었다. 이 센터의 운영목적은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거주 생활인에게 전환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센터는 자립생활주택(자립생활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 기능이 자립생활주택(가형, 나형)으로 통합되었음)지원, 전세자금지원, 임대아파트 이전 등의 많은 제도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시설에서 거주하지 않지만 지역사회복귀가 필요한 지역과 병원의 장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제도가 되고 있다. 병원생활을 오래하는 척수장애인들이나 지역사회로 돌아가서도 칩거를 하는 척수장애인들에게는 이런 제도가 남의 일이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제도를 이용하려면 시설에 1년 이상 거주했다가 나오면 된다는 씁쓸한 이야기가 있다. 정신장애인들도 지역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과정들이 있는데 같은 병원생활을 하는 척수장애인들은 이런 것들이 남의 일이다.
현재의 병원의 재활시스템은 중도장애인들이 어떻게 장애를 수용하고 자기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일상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활 체력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는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데에 큰 과오가 있다.
그저 오랜 시간동안 의료적인 재활로만 시간을 보내고 자존감은 회복되지 않은 채 지역사회로 떨어지고 그 안에서도 방치가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남 보기에는 아무 일 없이 보이지만 그들은 삶의 위기를 느끼고 있다. 이는 시설의 장애인과 별 다를 바가 없다. 중도장애인의 특히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시스템은 이렇듯 엉망이다. 이는 차별적인 문제이고 인권적인 문제이다. 장애는 극복이 아니라 수용의 문제이다. 수용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척수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의료재활의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병원 안에서 충분하게 사회복귀훈련을 통해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자신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해야 한다. 의료적 재활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직업적 재활훈련이 병행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재활병원의 책임부여와 이에 해당하는 수가를 지급하고,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다. 이때의 전문 인력은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의료계 내부의 복잡한 문제로 해결이 어렵다면 민간에 사회복귀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병원생활을 마치자마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척수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상홈 프로그램이 좋은 본보기이다. 둘째, 지역사회에 제대로 안착시키는 방안이다. 척수장애인 중 일부는 주택의 접근성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가족내부의 문제 등으로 퇴원을 하고 싶지만 병원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부류들이 있다. 계단이 많아서 도저히 휠체어로 갈 수가 없는 집을 팔아야 하거나 이사를 가야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주택을 신청하고 대기해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이런 부류들을 위해 당분간 거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시기를 늦춘다면 사회복귀에 대한 동력이 부족하게 되어 수동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시설장애인뿐만 아니라 척수장애인과 같은 중도장애인들도 전환서비스가 필요한 이유이다. 자립생활의 범위를 탈시설 장애인뿐만 아니라 중도장애인에게도 기회를 확대해야하는 이유이다. 다행히 올해 서울시가 재가 장애인을 위한 체험홈 6개를 시범적으로 운영했다고 한다. 그 결과를 투명하고 공개하고 많은 관련 단체들과 장애인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천광역시도 재가 및 거주시설에서 생활해 온 중증장애인 중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체험홈을 기존 6개소에서 7개소로 늘리고 18명이 동시에 자립생활 체험이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몇몇 지자체위주의 탈시설정책과 지원이 있었지만 늦게나마 보건복지부도 탈시설-자립생활정책에 힘을 싣는다고 들었다. 만일 그렇다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관련된 정확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 어떤 유형의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아야하는 당연한 권리로부터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 선천적인 장애인이나 후천적인 장애인이나, 시설에 거주하던 가정이나 병원에서 있던 자립생활에 대한 그 권리마저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상황에 놓인 장애인들이 현실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안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장애인복지일 것이다. |
|||
| [비마이너]당사자주의, 제도화, 운동성...장애인단체 앞에 놓인 여전한 고민거리 | |||
| [에이블뉴스]시각장애인, ‘정보공개 내용’ 음성 확인 가능 | |||
|
|